다빈치와 가우디, 숲에서 놀면서 천재성을 드러내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숲에 안긴 뒤에 잠재된 재능 폭발
숲에서 불후의 역작 완성한 베토벤·괴테도 빼놓을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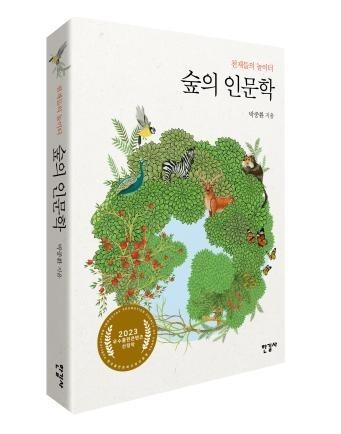
‘숲의 인문학(천재들의 놀이터)’(한길사)은 다빈치, 뉴턴, 아인슈타인, 다윈, 루소, 칸트, 베토벤, 밀, 괴테, 처칠, 세잔, 가우디, 디즈니, 에디슨, 잡스 등 ‘천재 ’15명의 삶을 추적해 천재성이 언제 어떻게 발현하고 폭발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를테면 천재들이 몇 살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업적으로 천재성을 발현했는지 살펴본다. 생애와 성장환경을 통해 천재가 숲과 맺은 인연을 확인하고, 세상에 없던 개념을 찾아낸 천재와 그렇게 하지 못한 수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본다.
어린 시절을 숲에서 놀면서 보낸 다빈치와 가우디는 젊어서부터 천재성을 드러냈다. 숲을 학교로 삼고 하루 종일 숲에서 놀던 다빈치는 라틴어는커녕 이탈리아어도 겨우 읽고 썼다. 다빈치는 숲을 관찰하며 습득한 천재적인 그림 실력을 뽐내며 14세에 화가 안토니오 델 베로키오의 공방에 들어갔고 20세에는 스승을 뛰어넘었다.
가우디는 선천적인 류머티즘 탓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숲에서 나뭇가지와 잎으로 집을 지으며 놀았다. 주말마다 등산하며 건강을 되찾은 그는 ‘바보 아니면 천재’라는 평가를 받으며 건축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가우디는 건축가 자격증을 따고 바로 다음 해인 26세에 ‘카사 비센스’를 지어 명성을 떨쳤다. 그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서로 의지하며 태풍을 이겨내는 침엽수림에서 설계를 따왔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도시를 떠나 숲에 안긴 뒤에 잠재된 재능을 폭발시켰다. 뉴턴은 흑사병이 런던을 덮친 1665년 외갓집인 시골 울즈소프 농장으로 피신했다. 뉴턴은 그곳 농장에서 만유인력의 법칙뿐 아니라 빛과 색깔 그리고 물체의 운동에 관한 이론을 고안했고 미적분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른바 과학계에서 ‘기적의 해’라고 불리는 시기다.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꿈이었던 아인슈타인은 한적한 숲의 도시 베른으로 이주하고 3년 뒤 광전효과 이론,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까지 네 편의 논문을 써냈다. 베른의 공원이 내려다보이는 특허사무소 의자에서 떠올린 아이디어는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안겨줬고, 현대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제2의 ‘기적의 해’로 알려졌다.
숲에서 불후의 역작을 완성한 베토벤과 괴테도 빼놓을 수 없다. 피아노 연주자로 유명했던 베토벤은 33세 때 귓병을 치료하기 위해 숲으로 둘러싸인 전원마을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요양한다. 이듬해 아예 하일리겐슈타트 바로 옆인 빈으로 이주하고는 교향곡 제3번 ‘영웅’, 제5번 ‘운명’, 제6번 ‘전원’을 비롯한 수많은 명곡을 쏟아내면서 작곡가로서 절정의 재능을 뽐냈다.
괴테는 45세 때 바이마르 공국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 식물원장으로 취임한 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헤르만과 도로테아’를 써 독일 고전주의의 씨앗을 심었다. 식물원장마저 그만둔 괴테는 저택 주변에 직접 정원을 가꾸면서 ‘에그몬트’ ‘이탈리아 기행’ ‘파우스트’ 등의 명저를 완성해냈다.
저자는 천재들이 천재성을 폭발시킨 곳은 숲이라고 설명한다. 숲은 오감의 자극을 경험하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평가한다. 숲은 인류 문명을 낳았지만, 문명은 숲을 사막화시키고 이를 파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해결책도 제시한다.
전직 ‘시사저널’ 기자였던 저자 박중환(73)은 운명처럼 다가온 식물의 경이로운 생명력에 매료되어 식물과 숲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물론 숲을 보존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교보문고 이달의 책’, ‘세종도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도서’에 선정된 ‘식물의 인문학’을 펴낸 바 있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새 책] 『2026 세계대전망』 -이코노미스트](/news/data/20251215/p1065538961079813_776_h2.jpg)
![[Issue Hot]이석연, 與에 "당리당략에 국민 실망…법왜곡죄 재고해야" 쓴소리](/news/data/20251211/p1065596690416813_787_h2.png)
![[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사의, 부산시장 선거판도 '요동'](/news/data/20251211/p1065570127761735_198_h2.png)
![[국방] K-방산 또 '쾌거'...K2 '흑표' 등 페루 2조원대 수출](/news/data/20251210/p1065569486378030_820_h2.png)







